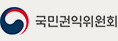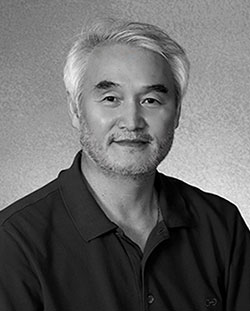[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64] "다시 분단선으로" (매경프리미엄, 2022.09.1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60회 작성일 22-10-06 18:55본문
[베를린에서 백두산으로 - 64] "다시 분단선으로" (매경프리미엄, 2022.09.19)
DMZ·접경지역에 서서 여기가 최북단지역, 북방한계지역이구나 생각한다면 '남한 주민'이다. 여기가 우리 국토의 중심, 동북아의 축(軸)이구나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진> ▲ 다시 분단선으로.
분단된 상황이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단의 벽을 허물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리라는 각오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 방향으로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통일 지상주의(至上主義)'가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 국제사회가 더 잘살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민족끼리 소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암울하다.
DMZ·접경지역은 변해야 한다. 첫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피해자'다. 분단의 질곡 속에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개발, 사회기반시설,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과 주민은 불이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DMZ·접경지역 바깥 지역과 주민의 발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담이 되면서, 담 속에 갇힌 한계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둘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가해자'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DMZ·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통제·규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는 더욱 깊고 넓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 ▲ 다시 분단선으로
DMZ·접경지역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희망에 찬 일상을 맞고 살아야 한다.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극복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허리에 위치한 DMZ·접경지역이 변화되지 않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아니라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인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남북 간 어떠한 합의, 대화, 선언도 상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다. 그 점철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 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남북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남쪽 접경지역이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새로운 모델이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인력과 물자가 DMZ를 지나 남북 접경지역을 오르내리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 상황만이 한반도 평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 DMZ·접경지역 주민이 분단 피해자, 분단 가해자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통일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둘째, DMZ·접경지역은 '남북 통합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접촉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거나,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남북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남북 DMZ·접경지역이다. 남북 주민이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이다.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 간에, 남북 DMZ·접경지역 간에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남북 주민 전체의 통합, 한반도 전 지역의 통합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DMZ·접경지역 간,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 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한반도 전역의 지역과 주민 통합을 추동할 수 있도록 DMZ·접경지역이 준비되고 발전해야 한다.
셋째, DMZ·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DMZ·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쇼윈도'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화, 한계적 성장이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경주하여 DMZ·접경지역을 남쪽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예술, 환경생태보호의 수준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이 가지는 이러한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DMZ·접경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과 DMZ·접경지역 주민에게 그 밖의 지역과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내리고 확산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은 우선적이고도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혹은 별개로 우리 DMZ·접경지역이 '분단 극복의 선봉', '남북 통합의 선봉',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사회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DMZ·접경지역이 국가 성장은 물론이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남북한 DMZ·접경지역을 한반도·동북아 중심지로 새롭게 조명하고, '한반도의 선봉지역' '동북아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꽉 닫힌 현 한반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더 넓은 시각, 긴 호흡으로 DMZ·접경지역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1393㎞ 동서독 접경선 종주, 금강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여정,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이제 고른다. 동서독 접경선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나 겹겹한 철조망과 장애물과 벙커, 지뢰와 대·중·소 구경 각종 화기와 무기로 절단된 DMZ·접경지역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If I Can Dream”을 힘차게 부르며, 분단선으로 향한다.
손기웅
베를린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통일연구원에 봉직했으며 지금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한국DMZ학회장, 한독통일포럼 공동대표, 중국 톈진외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1·2' '30년 독일통일의 순례: 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통일, 온 길 갈 길' 등 저서가 있다.
DMZ·접경지역에 서서 여기가 최북단지역, 북방한계지역이구나 생각한다면 '남한 주민'이다. 여기가 우리 국토의 중심, 동북아의 축(軸)이구나 생각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진> ▲ 다시 분단선으로.
분단된 상황이 현실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분단의 벽을 허물어 민족이 하나가 되고 통일된 국가를 이루리라는 각오를 항상 마음에 간직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그 방향으로 하나씩, 조금씩 실천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이다.
'통일 지상주의(至上主義)'가 아니라, 통일이 되어야만 한반도에서 살고 있는 모든 한민족이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주변국, 국제사회가 더 잘살기 위해 무한경쟁을 펼치고 있는 마당에 같은 민족끼리 소모적인 대결을 벌이고 있는 한, 우리 민족의 장래는 암울하다.
DMZ·접경지역은 변해야 한다. 첫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피해자'다. 분단의 질곡 속에서,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재산권, 개발, 사회기반시설, 복지 등 모든 측면에서 지역과 주민은 불이익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DMZ·접경지역 바깥 지역과 주민의 발전과 행복을 지켜주는 담이 되면서, 담 속에 갇힌 한계생활을 감내해야 했다.
둘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가해자'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지 않고, 북한의 군사 도발이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함에 따라 DMZ·접경지역의 군사화와 통제·규제는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분단의 골은 더욱 깊어졌고, 피해자가 스스로에게 가해자가 되어 피해는 더욱 깊고 넓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
<사진> ▲ 다시 분단선으로
DMZ·접경지역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 주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희망에 찬 일상을 맞고 살아야 한다. '절망의 상징'에서 '희망의 상징'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이 한반도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
첫째, DMZ·접경지역은 '분단 극복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허리에 위치한 DMZ·접경지역이 변화되지 않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 없다. 비무장지대(DeMilitarized Zone)가 아니라 세계 제1의 중무장지대인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을 그대로 두고 이루어지는 남북 간 어떠한 합의, 대화, 선언도 상호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상누각(砂上樓閣)이 될 수 있다. 그 점철의 역사가 그것을 증언하고 있다.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의 평화적 이용이 실현되어야 한다. 북한 쪽 접경지역에서만 이루어지는 남북협력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남쪽 접경지역이 분단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데 도움이 될 수 없다.
DMZ를 가운데 두고 남북한 접경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DMZ·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이란 새로운 모델이 실현되어야 한다. 남북한과 국제사회의 인력과 물자가 DMZ를 지나 남북 접경지역을 오르내리고, 그 속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협력 상황만이 한반도 평화를 현실화할 수 있다. DMZ·접경지역 주민이 분단 피해자, 분단 가해자란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통일의 창이 열릴 수 있다.
둘째, DMZ·접경지역은 '남북 통합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향후 한반도에서 접촉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거나, 통일을 향한 움직임이 일어날 경우, 남북 주민이 가장 먼저 찾는 곳이 남북 DMZ·접경지역이다. 남북 주민이 가장 먼저 만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이다.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 간에, 남북 DMZ·접경지역 간에 통합이 잘 이루어지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남북 주민 전체의 통합, 한반도 전 지역의 통합에 긍정적 혹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남북 DMZ·접경지역 간, 남북 DMZ·접경지역 주민 간의 성공적인 통합이 한반도 전역의 지역과 주민 통합을 추동할 수 있도록 DMZ·접경지역이 준비되고 발전해야 한다.
셋째, DMZ·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되어야 한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DMZ·접경지역은 남쪽 대한민국의 '쇼윈도'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분단 상황 속에서 군사화, 한계적 성장이란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과 지원을 경주하여 DMZ·접경지역을 남쪽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예술, 환경생태보호의 수준을 압축적,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이 가지는 이러한 국가적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DMZ·접경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전 국민이 가질 수 있도록 논의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의 발전이 다른 지역의 발전에, 다른 지역 사람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 DMZ·접경지역과 DMZ·접경지역 주민에게 그 밖의 지역과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이 뿌리내리고 확산되어야 한다.
향후 남북관계에서 DMZ를 포함하는 접경지역 평화적 이용은 우선적이고도 필수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 그와 동시에 혹은 별개로 우리 DMZ·접경지역이 '분단 극복의 선봉', '남북 통합의 선봉', '남쪽 대한민국의 선봉'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정책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 사회단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DMZ·접경지역이 국가 성장은 물론이고 민족의 숙원인 통일 준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한다.
남북한 DMZ·접경지역을 한반도·동북아 중심지로 새롭게 조명하고, '한반도의 선봉지역' '동북아 평화의 축'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꽉 닫힌 현 한반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정부는 더 넓은 시각, 긴 호흡으로 DMZ·접경지역 변화를 위한 국가전략을 가다듬어야 한다.
1393㎞ 동서독 접경선 종주, 금강산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여정, 가쁘게 몰아쉬던 숨을 이제 고른다. 동서독 접경선의 5분의 1도 되지 않는, 그러나 겹겹한 철조망과 장애물과 벙커, 지뢰와 대·중·소 구경 각종 화기와 무기로 절단된 DMZ·접경지역을 마주해야 하기 때문이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신념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의 “If I Can Dream”을 힘차게 부르며, 분단선으로 향한다.
손기웅
베를린장벽 붕괴를 현장에서 체험하고 통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원장으로 퇴임할 때까지 통일연구원에 봉직했으며 지금은 한국평화협력연구원장, 한국DMZ학회장, 한독통일포럼 공동대표, 중국 톈진외대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독일통일: 쟁점과 과제 1·2' '30년 독일통일의 순례: 동서독 접경 1393㎞, 그뤼네스 반트를 종주하다'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 '통일, 온 길 갈 길' 등 저서가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