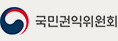[손기웅의 통일문] "文이 ‘서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해수부 공무원은 살아있었다" (최보식의 언론, 20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384회 작성일 22-07-11 12:21본문
[손기웅의 통일문] "文이 ‘서해 사건’을 인지했을 때 해수부 공무원은 살아있었다" (최보식의 언론, 2022.06.19)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424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한 해안에서 발생했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의 원인과 경과에 관해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정부 보고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정치타산적 이유로 만약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면 역사 앞에는 물론이고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예우를 박탈당해야 한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 KBS News
40년 분단 기간 동서독 간에도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이념적, 체제적 대결 속에 나타난 불가항력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그럴 수가‥’라는 실망감을 금치 못할 일들이 있었다.
동독이 아니라 서독의 정치권,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공히 모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길을 걸은 적이 있다. 동독 독재정권, 인권을 유린하고 폭압적으로 군림했던 동독의 반인도적 행태에 서독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 많은 서독인이, 독일인이 안타까운 생명을 바쳐야만 했던 역사다.
특히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았고 문을 열었던, 존경받는 정치 수장들이 보여준 ‘정치타산적 행태’는 그들의 세기적 정치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다. 아직 분단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준엄한 반면교사(反面敎師)다.
1966년 8월 29일 서베를린 주민 하인쯔 쉬미트는 술에 취한 채 동서 베를린 분단선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에 뛰어들어 동베를린 관할구역에 들어갔다. 비무장의 민간인인 그를 동독 국경수비대원은 조준 사격으로 사살하였다. 동독은 쉬미트 사건이 ‘서베를린에 의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사살을 동독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옹호하고, 사살자들을 표창하였다.
1983년 4월 10일 동서독 접경선의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검문을 받던 서독여행객 루돌프 부르케르트가 사망했다. 동독은 심장경색을 사인이라고 했으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세 명의 동독세관원들이 그를 구타했다.
4월 26일에도 서독여행객 하인쯔 몰덴하우어 역시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세관 심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동독은 역시 심장마비라 주장했다.
쉬미트 사건 당시 서베를린 시장은 훗날 독일통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였다. 진보당인 사민당(SPD)으로 1957년부터 시장으로 재임한 그는 1961년 8월 13일 기습적으로 세워진 베를린장벽, 그로 인한 이산과 분단의 아픔, 자유를 찾기 위해 그것을 넘으려다 쓰러진 생명 등 누구보다 동독의 반인도적 만행을 생생하고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다.
사건이 발생한 1966년 8월 29일은 그의 시장 임기(1957년 10월~1966년 12월)의 막바지였고, 연방 부수상 겸 외무상(1966년 12월 1일 서베를린 시장직 사임 후 취임)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1969년 서독 연방수상이 된 후, 동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바꾸고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에 입각한 대(對)동독 접근정책을 펼쳤다. 공식적으로는 수상이 된 후 신동방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이미 1963년 7월에 신동방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그의 보좌관 에곤 바(Egon Bahr)와 함께 투칭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상호 인정에 기반한 ‘새로운 긴장 완화 개념(neue Entspannungskonzept)’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독일정책(Deutschlandspolitik)’을 구상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가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시기에 일어난 쉬미트 사건과 관련하여 브란트가 동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수상으로 취임하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동독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한 서독 ‘정부적 차원’의 태도를 바꾸었다. 브란트 정부는 동독과의 접근과 관계 개선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베를린장벽과 사살희생자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언어적으로 크게 자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브란트 정부는 장벽에서의 사살 사망이 독-독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보았다.
서독은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 시기인 1961년 11월부터 잘쯔기터에 동독체제가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기록하는 기록보존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서베를린의 검찰청에도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브란트 정부 내에서는 심지어 독-독 관계의 개선을 위해 잘쯔기터 기록보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건 당시의 서독 수상은 보수당인 기민당(CDU)의 헬무트 콜(Helmut Kohl)이었다. 콜은 브란트-쉬미트로 이어진 전임 진보정권 이상의 독-독 관계상 성과를 기대하였다. 헬무트 쉬미트(Helmut Schmidt)가 수상 시 제안했던 동서독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
콜은 수상으로 취임하자마자 동독공산당 정부와 꾸준하게 타협점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선은 그가 비난했던 70년대 전임 진보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브란트/쉬미트와 마찬가지로 양독 간에 ‘적응과 협력 사이의 정치(eine Politik zwischen Anpassung und Kooperation)’를 추진하면서 동독공산당의 안정을 원했다.
1983년 1월 24일, 수상 취임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콜과 동독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 콜은 전임정부가 추진했던 독일정책 상의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을, 집권여당 내 우파들이 브란트가 동독과 합의한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만 콜은 지속할 것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동독과 서독은 “나쁜 날씨에도 함께 살아야만 한다(auch bei schlechterem Wetter miteinander leben)”고 말했다고 통일 이후 밝혀진 당시 동독이 녹음한 전화통화기록이다.
한편 당시 바이에른 주지사인 프란쯔 요셉 슈트라우쓰(Franz Josef Strauß)는 콜의 정적이자 강력한 차기 수상 후보였다. 그는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유화적인 독일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정권인 콜정부가 독일정책을 다시 원칙에 입각한 강경노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호네커의 서독 초청을 취소하고, 외교정책 상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3년 4월 10일 부르케르트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독 내에서는 동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슈트라우쓰는 ‘살인사건(Mordfall)’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콜은 동독과의 관계 개선,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계속 기대했다. 4월 18일 호네커에게 “불필요한 공개적인 인신공격에 부채질하고 싶지 않다(keine unnötige öffentliche Polemik entfachen)”면서, 자신은 서기장의 서독방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4월 26일 몰덴하우어가 다시 사망하자, 서독 내에서는 호네커가 서독으로 온다면 국경폐쇄와 인권침해로 그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콜은 격앙된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론과 우파로부터의 압력을 완전히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전임 슈미트의 말, “방문 그 자체를 가치로 보는 방문은 결코 우리의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Ein Besuch, den man als Wert für sich ansieht, kann nie unsere Politik sein)”를 인용하면서 물러섰다.
가장 큰 우려는 자신의 긴장 완화 정책이 서독 여행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공격받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서독 내독성장관 라이너 바르쩰(Rainer Barzel)이 ‘행동 대 보답(Leistung und Gegenleistung)’의 원칙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호네커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4월 28일 호네커는 서독방문을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콜이 독일정책 상에서 변화가 아니라 지속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었던 상황에서 호네커가 서독방문을 취소한다는 소식은 콜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타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콜은 호네커의 서독방문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네커가 독-독 간의 피해를 작게 유지하는데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서, 호네커의 서독방문 취소가 ‘금년에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호네커의 서독 방문은 1987년 9월 7일 이루어졌다.
콜 수상의 독-독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 서독 정부는 사망사건에 대해 강력한 항의, 대항 조치, 관계 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일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도 동독은 개선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독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근거도 방법도 없었다.
분단 기간 동안 1961년 세워진 베를린장벽에서의 총격 사망자의 수는 적게는 92명 많게는 445명으로 집계된다. 사건이 일어난 환경, 사망자 범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망자의 수를 산정하는데 차이가 있다. 분단 기간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사망한 서독여행객의 수는 최소한 350명에 달하였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동독은 사망확인문서에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natürlicher Tod durch Herzinfarkt)’라 기록하였다.
쉬미트 및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건 모두 서독은 동독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독이 동독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정치타산적 고려가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내적으로 힘을 모으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분단 기간 최대 455명의 접경지역 사살과 350명의 국경검문소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브란트와 콜, 두 거인(巨人)이 있었기에 독일통일이 가능했다. ‘분단 관리적 시각’에 입각한 독일정책을 벗어나 ‘통일 지향적 시각’을 가졌더라면, 원칙에 입각한 독일정책을 펼쳤더라면 통일은 더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쓰러진 생명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독 체제는 서독의, 서독 정치수장의 정치타산적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독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독 외에는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내리는 판단과 역사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했던 결정 간에는 무수한 변수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내릴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반드시 짚어야 할 진실이 있다. 쉬미트 및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례는 발생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태에 대한 서독 진보/보수정부 수장의 대응이 보여준 문제였다.
반면 이번 서해 사태의 경우 문재인이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이대준 씨는 살아있었다. 10시간, 최소한 3시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당시 남북관계가 헝클어진 상황이긴 하였지만, 이미 네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던 문재인은 이대준 씨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문재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15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이 열려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기보다 지금이라도 일단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겉으로나마 치장했던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안다.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https://www.bosik.kr/news/articleView.html?idxno=7424
2020년 9월 22일 서해 북한 해안에서 발생했던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살 사건의 원인과 경과에 관해 정권이 바뀌면서 완전히 다른 정부 보고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이 정치타산적 이유로 만약 사실을 왜곡하고 은폐했다면 역사 앞에는 물론이고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문재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는 예우를 박탈당해야 한다.
<사진>문재인 전 대통령 / KBS News
40년 분단 기간 동서독 간에도 수많은 가슴 아픈 일들이 벌어졌고,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 과정에서 이념적, 체제적 대결 속에 나타난 불가항력이었다고 치부하기에는 ‘그럴 수가‥’라는 실망감을 금치 못할 일들이 있었다.
동독이 아니라 서독의 정치권, 진보정권과 보수정권 공히 모두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길을 걸은 적이 있다. 동독 독재정권, 인권을 유린하고 폭압적으로 군림했던 동독의 반인도적 행태에 서독 정치권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함으로 인해 더 많은 서독인이, 독일인이 안타까운 생명을 바쳐야만 했던 역사다.
특히 독일통일의 초석을 놓았고 문을 열었던, 존경받는 정치 수장들이 보여준 ‘정치타산적 행태’는 그들의 세기적 정치업적에도 불구하고, 그 뒤에 짙게 드리워진 그림자다. 아직 분단의 끝을 가늠할 수 없는 우리에게, 정치 지도자에게 준엄한 반면교사(反面敎師)다.
1966년 8월 29일 서베를린 주민 하인쯔 쉬미트는 술에 취한 채 동서 베를린 분단선을 관통하여 흐르는 하천에 뛰어들어 동베를린 관할구역에 들어갔다. 비무장의 민간인인 그를 동독 국경수비대원은 조준 사격으로 사살하였다. 동독은 쉬미트 사건이 ‘서베를린에 의한 의도적 도발’이라고 주장하고, 사살을 동독의 영토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옹호하고, 사살자들을 표창하였다.
1983년 4월 10일 동서독 접경선의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검문을 받던 서독여행객 루돌프 부르케르트가 사망했다. 동독은 심장경색을 사인이라고 했으나,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세 명의 동독세관원들이 그를 구타했다.
4월 26일에도 서독여행객 하인쯔 몰덴하우어 역시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세관 심사를 받던 중 사망했다. 동독은 역시 심장마비라 주장했다.
쉬미트 사건 당시 서베를린 시장은 훗날 독일통일의 아버지라 불리는 빌리 브란트(Willy Brandt)였다. 진보당인 사민당(SPD)으로 1957년부터 시장으로 재임한 그는 1961년 8월 13일 기습적으로 세워진 베를린장벽, 그로 인한 이산과 분단의 아픔, 자유를 찾기 위해 그것을 넘으려다 쓰러진 생명 등 누구보다 동독의 반인도적 만행을 생생하고 깊이 체험했던 사람이다.
사건이 발생한 1966년 8월 29일은 그의 시장 임기(1957년 10월~1966년 12월)의 막바지였고, 연방 부수상 겸 외무상(1966년 12월 1일 서베를린 시장직 사임 후 취임)을 앞둔 시점이었다.
그는 1969년 서독 연방수상이 된 후, 동독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바꾸고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에 입각한 대(對)동독 접근정책을 펼쳤다. 공식적으로는 수상이 된 후 신동방정책을 펼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는 이미 1963년 7월에 신동방정책의 설계자로 알려진 그의 보좌관 에곤 바(Egon Bahr)와 함께 투칭에서 ‘접근을 통한 변화(Wandel durch Annäherung)’, 상호 인정에 기반한 ‘새로운 긴장 완화 개념(neue Entspannungskonzept)’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이미 새로운 ‘독일정책(Deutschlandspolitik)’을 구상하고 있었던 시점에, 그가 서베를린 시장이었던 시기에 일어난 쉬미트 사건과 관련하여 브란트가 동독에 대해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언급은 찾을 수 없다. 더구나 그는 수상으로 취임하고 신동방정책을 추진하면서 자유를 찾아 서독으로 탈출하려다 동독에 의해 사살된 사건에 대한 서독 ‘정부적 차원’의 태도를 바꾸었다. 브란트 정부는 동독과의 접근과 관계 개선에 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베를린장벽과 사살희생자에 대한 입장표명에서 언어적으로 크게 자제하는 표현을 사용했다. 브란트 정부는 장벽에서의 사살 사망이 독-독 관계에 대한 부담으로 보았다.
서독은 콘라드 아데나워(Konrad Adenauer) 정부 시기인 1961년 11월부터 잘쯔기터에 동독체제가 자행하는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기록하는 기록보존소를 운영하였다. 또한 서베를린의 검찰청에도 사건을 자세히 기록하였다. 브란트 정부 내에서는 심지어 독-독 관계의 개선을 위해 잘쯔기터 기록보존소를 폐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건 당시의 서독 수상은 보수당인 기민당(CDU)의 헬무트 콜(Helmut Kohl)이었다. 콜은 브란트-쉬미트로 이어진 전임 진보정권 이상의 독-독 관계상 성과를 기대하였다. 헬무트 쉬미트(Helmut Schmidt)가 수상 시 제안했던 동서독 정상회담을 계속 추진하고자 했다.
콜은 수상으로 취임하자마자 동독공산당 정부와 꾸준하게 타협점을 모색했다. 이러한 노선은 그가 비난했던 70년대 전임 진보정부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브란트/쉬미트와 마찬가지로 양독 간에 ‘적응과 협력 사이의 정치(eine Politik zwischen Anpassung und Kooperation)’를 추진하면서 동독공산당의 안정을 원했다.
1983년 1월 24일, 수상 취임 4개월 후에 이루어진 콜과 동독공산당 서기장 에리히 호네커(Erich Honecker) 간의 첫 전화통화에서 콜은 전임정부가 추진했던 독일정책 상의 어떠한 변화도 없을 것을, 집권여당 내 우파들이 브란트가 동독과 합의한 「기본조약」(Grundlagenvertrag)의 수정을 공개적으로 요구하지만 콜은 지속할 것을, 계속 발전시킬 것을 약속했다. 동독과 서독은 “나쁜 날씨에도 함께 살아야만 한다(auch bei schlechterem Wetter miteinander leben)”고 말했다고 통일 이후 밝혀진 당시 동독이 녹음한 전화통화기록이다.
한편 당시 바이에른 주지사인 프란쯔 요셉 슈트라우쓰(Franz Josef Strauß)는 콜의 정적이자 강력한 차기 수상 후보였다. 그는 진보정권이 추진했던 유화적인 독일정책을 비판하고, 보수정권인 콜정부가 독일정책을 다시 원칙에 입각한 강경노선으로 변경해야 하며, 호네커의 서독 초청을 취소하고, 외교정책 상 미국과 함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83년 4월 10일 부르케르트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자 서독 내에서는 동독에 대한 비난이 쏟아졌다. 슈트라우쓰는 ‘살인사건(Mordfall)’이라고 소리 높였다.
그러나 콜은 동독과의 관계 개선, 호네커의 서독방문을 계속 기대했다. 4월 18일 호네커에게 “불필요한 공개적인 인신공격에 부채질하고 싶지 않다(keine unnötige öffentliche Polemik entfachen)”면서, 자신은 서기장의 서독방문에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4월 26일 몰덴하우어가 다시 사망하자, 서독 내에서는 호네커가 서독으로 온다면 국경폐쇄와 인권침해로 그를 교수형에 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콜은 격앙된 국내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려고 노력했지만, 여론과 우파로부터의 압력을 완전히 진정시킬 수는 없었다. 그는 전임 슈미트의 말, “방문 그 자체를 가치로 보는 방문은 결코 우리의 정책이 될 수 없습니다(Ein Besuch, den man als Wert für sich ansieht, kann nie unsere Politik sein)”를 인용하면서 물러섰다.
가장 큰 우려는 자신의 긴장 완화 정책이 서독 여행자들의 죽음을 초래했다고 공격받는 것이었다. 그제서야 서독 내독성장관 라이너 바르쩰(Rainer Barzel)이 ‘행동 대 보답(Leistung und Gegenleistung)’의 원칙이 이 사건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호네커가 가해자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결국 4월 28일 호네커는 서독방문을 철회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콜이 독일정책 상에서 변화가 아니라 지속으로 생각을 굳히고 있었던 상황에서 호네커가 서독방문을 취소한다는 소식은 콜에게 커다란 충격이자 타격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콜은 호네커의 서독방문에 미련을 버리지 않았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호네커가 독-독 간의 피해를 작게 유지하는데 여전히 관심이 있다면서, 호네커의 서독방문 취소가 ‘금년에는’ 오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호네커의 서독 방문은 1987년 9월 7일 이루어졌다.
콜 수상의 독-독 관계 개선에 대한 강한 의지로 인해 서독 정부는 사망사건에 대해 강력한 항의, 대항 조치, 관계 악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동일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도 동독은 개선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서독은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할 근거도 방법도 없었다.
분단 기간 동안 1961년 세워진 베를린장벽에서의 총격 사망자의 수는 적게는 92명 많게는 445명으로 집계된다. 사건이 일어난 환경, 사망자 범위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사망자의 수를 산정하는데 차이가 있다. 분단 기간 동독 국경검문소에서 사망한 서독여행객의 수는 최소한 350명에 달하였다. 그들의 사망 원인은 여전히 불투명하며, 동독은 사망확인문서에 대부분 ‘심근경색으로 인한 자연사(natürlicher Tod durch Herzinfarkt)’라 기록하였다.
쉬미트 및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건 모두 서독은 동독에 적극적인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서독이 동독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에 대해 정치타산적 고려가 아닌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국내적으로 힘을 모으고, 국제적 지지를 호소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적극적 조치를 취했더라면, 분단 기간 최대 455명의 접경지역 사살과 350명의 국경검문소 사망자의 수가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다.
브란트와 콜, 두 거인(巨人)이 있었기에 독일통일이 가능했다. ‘분단 관리적 시각’에 입각한 독일정책을 벗어나 ‘통일 지향적 시각’을 가졌더라면, 원칙에 입각한 독일정책을 펼쳤더라면 통일은 더 앞당겨질 수 있었을 것이다. 쓰러진 생명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동독 체제는 서독의, 서독 정치수장의 정치타산적 태도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독과 관계를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서독 외에는 달리 선택할 대안이 없었다.
지나간 역사를 돌아보며 내리는 판단과 역사의 현장에서 선택해야 했던 결정 간에는 무수한 변수와 인식의 차이가 존재한다. 이를 인정하면서도 내릴 수밖에 없는 주장이다.
반드시 짚어야 할 진실이 있다. 쉬미트 및 부르케르트/몰덴하우어 사례는 발생한, 피해자가 이미 사망한 사태에 대한 서독 진보/보수정부 수장의 대응이 보여준 문제였다.
반면 이번 서해 사태의 경우 문재인이 사건을 인지하였을 때 이대준 씨는 살아있었다. 10시간, 최소한 3시간이나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응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
당시 남북관계가 헝클어진 상황이긴 하였지만, 이미 네 번이나 김정은을 만났던 문재인은 이대준 씨의 생명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은 문재인은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었다.
15년이 지나 대통령기록물이 열려 진실이 드러나고, 역사의 심판을 받기보다 지금이라도 일단 유족과 국민 앞에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그나마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겉으로나마 치장했던 문재인이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그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 모두는 안다. 장삼이사(張三李四)가 어쩌다 대통령이 되었으니.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