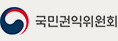[베를린에서 백두산까지 - 31] "'기억의 원', 조르게" (매경 프리미엄: 2022.01.3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695회 작성일 22-02-03 23:16본문
[베를린에서 백두산까지 - 31] "'기억의 원', 조르게" (매경 프리미엄: 2022.01.31)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1/31460/
분단 극복은 적대했던 인간 간에는 물론이고 자연환경 간에, 인간과 자연환경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도 자연환경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인간에 의해 침해된 자연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르게 상처를 매만지고 있다.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Freiland-Grenzmuseum Sorge)'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다시 하나되어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니 야외박물관이 보인다. 현장감에 긴장감을 더하려는 듯 철조망과 통문이 당시 사용되었던 실물이라는 표지가 입구에 붙어 있다. 분단 시기의 독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의 시설물들을 원형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다.
▲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 입구 / 사진=손기웅
입구를 지나자 하늘을 찌르듯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두 줄로 이어진 동독군 차량 순찰로 코론넨벡(Kolonnenweg)이 맞는다. 두 길이 나란히 마주하는 분단의 길이자, 둘이 함께 온전한 한 길을 이루는 통일의 길이다.
탈출자를 잡기 위한 순찰로가 자연에 묻혀 땅의 일부가 되었다. 왜 총부리를 들이대었던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반성하고 후회하는 '통합의 길'이기도 하다.
▲ 우거진 수풀 속 코론넨벡 산책로 / 사진=손기웅
▲ 철조망장벽 아래를 흐르는 수로에 설치되었던 탈출 방어막, 자유를 향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막으려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담겨있다. / 사진=손기웅
▲ 개활지 군데군데 서 있는 일반용 감시탑(폭 2x2) / 사진=손기웅
청아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며 한참을 걷다 보면 '기억의 원(Ring der Erinnerung)'을 만난다. 죽음의 분단선을 생명의 띠로 바꾸어 인간과 자연환경이 다시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상징이다.
1993년 헤르만 프리간은 주변의 죽은 나무들로 원형의 담을 쌓았다. 직경 약 70m 원의 중간에 분단선이 'ㄱ'자로 꺾어지며 통과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나무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사이 죽은 나무들은 벌레 등 각종의 생명이 사는 삶의 공간이 된다. 쇠락(Verfall)과 성장(Wachstum)의 은유다.
분단으로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이를 자신의 옷으로 만들어 새로운 삶으로 되살아난다. 그리고 두 독일은 하나가 되어간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Schönheit)이고, '기억의 원'의 의도다.
'기억의 원'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의 입구를 만들고, 그 위에는 AER(공기), TERRA(흙), FAUNA(동물상), FLORA(식물상)를 그리고 원의 중앙에는 AQUA(물)를 새긴 표식돌을 땅에 박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공생한다는 의미다.
▲ ‘기억의 원’ 구성도와 조감도. 맨 위가 동서독 접경선이고 아래 ‘기억의 원’과 그것을 관통하는 ‘ㄱ’자 철조망장벽, 그 아래 두 줄의 코론넨벡이 삼엄히 이어진다. / 사진=손기웅·강동완
▲ ‘기억의 원’ 모습 / 사진=손기웅·강동완
▲ ‘기억의 원’에 남긴 9개의 철조망장벽 지주, 생태적 공생을 잊은 채 길고 아프게 실재했던 분단을 잊지 않는다. / 사진=손기웅
▲ ‘기억의 원’ 중앙의 물 표식돌 / 사진=손기웅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을 운영하는 조르게 박물관협회가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가을 마을의 옛 정거장 역사(驛舍)를 개조하여 '조르게 접경박물관(Sorge Grenzmuseum)'을 만들었다. 야외박물관에서 8분 거리인 이곳에는 당시 접경지역 상황을 조그만 모델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주민 200여 명의 휴양지 마을 조르게는 전쟁 이후 미군에 점령되었다가 다시 소련 점령지로 바뀌었다. 동서독으로 분단(서쪽의 니더작센주, 동쪽의 작센안할트주)된 후 동독이 500m 통제지대를 설정하자 그 안에 속한 조르게 주민도 출입이 통제되었다. 10가구는 사상 의심자로 찍혀 동독의 이른바 '독충(毒蟲) 계획'(15회 '호수 앞에 멈춘 자유, 멈추지 않은 자유행로' 참조)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다. 짙푸른 산림, 등산과 스키, 증기기차노선으로 즐겨 찾은 관광휴양지 조르게는 빛을 잃었다.
▲ 간이 정거장 조르게, 역사가 접경박물관이다. 이곳에서도 브로켄산을 오르는 협궤 증기기차를 탈 수 있다. / 사진=손기웅·Grenzmuseum Sorge e.V.
2021년 가을, 다시 찾은 조르게 야외박물관 곳곳에, 하르츠 국립공원 군데군데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져 누렇게 썩어가고 있다. 채 1년 전에 보지 못한 광경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라 한다. 산림 강국, 환경보호 강국 독일도 피하지 못한 지구촌 문제다. 그래도 동쪽과 서쪽이 힘을 합해 함께 대응하는 현실이 행복이고 부럽다.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밟았던 2007년 11월, 벗겨지고 붉어진 산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 황량해진 코론넨벡 숲길, 인간에 의해서다. /사진=손기웅
https://www.mk.co.kr/premium/special-report/view/2022/01/31460/
분단 극복은 적대했던 인간 간에는 물론이고 자연환경 간에, 인간과 자연환경 간에도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도 자연환경도 크나큰 상처를 입었다. 인간에 의해 침해된 자연환경은 인간에 의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빠르게 상처를 매만지고 있다.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Freiland-Grenzmuseum Sorge)'은 인간과 자연환경이 다시 하나되어감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다.
구불구불 산길을 오르니 야외박물관이 보인다. 현장감에 긴장감을 더하려는 듯 철조망과 통문이 당시 사용되었던 실물이라는 표지가 입구에 붙어 있다. 분단 시기의 독일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시의 시설물들을 원형대로 후세에게 전달하려는 의도다.
▲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 입구 / 사진=손기웅
입구를 지나자 하늘을 찌르듯 곧게 뻗은 나무 사이로 두 줄로 이어진 동독군 차량 순찰로 코론넨벡(Kolonnenweg)이 맞는다. 두 길이 나란히 마주하는 분단의 길이자, 둘이 함께 온전한 한 길을 이루는 통일의 길이다.
탈출자를 잡기 위한 순찰로가 자연에 묻혀 땅의 일부가 되었다. 왜 총부리를 들이대었던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싸움이었는지 반성하고 후회하는 '통합의 길'이기도 하다.
▲ 우거진 수풀 속 코론넨벡 산책로 / 사진=손기웅
▲ 철조망장벽 아래를 흐르는 수로에 설치되었던 탈출 방어막, 자유를 향하려는 의지가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을 막으려는 콘크리트와 철근에 담겨있다. / 사진=손기웅
▲ 개활지 군데군데 서 있는 일반용 감시탑(폭 2x2) / 사진=손기웅
청아한 공기를 깊숙이 들이며 한참을 걷다 보면 '기억의 원(Ring der Erinnerung)'을 만난다. 죽음의 분단선을 생명의 띠로 바꾸어 인간과 자연환경이 다시 하나되기를 염원하는 상징이다.
1993년 헤르만 프리간은 주변의 죽은 나무들로 원형의 담을 쌓았다. 직경 약 70m 원의 중간에 분단선이 'ㄱ'자로 꺾어지며 통과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죽은 나무들은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그사이 죽은 나무들은 벌레 등 각종의 생명이 사는 삶의 공간이 된다. 쇠락(Verfall)과 성장(Wachstum)의 은유다.
분단으로 훼손되고 파괴된 자연은 이를 자신의 옷으로 만들어 새로운 삶으로 되살아난다. 그리고 두 독일은 하나가 되어간다. 그것이 바로 아름다움(Schönheit)이고, '기억의 원'의 의도다.
'기억의 원'에는 동서남북 방향으로 4개의 입구를 만들고, 그 위에는 AER(공기), TERRA(흙), FAUNA(동물상), FLORA(식물상)를 그리고 원의 중앙에는 AQUA(물)를 새긴 표식돌을 땅에 박았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생태적으로 연결되어 공생한다는 의미다.
▲ ‘기억의 원’ 구성도와 조감도. 맨 위가 동서독 접경선이고 아래 ‘기억의 원’과 그것을 관통하는 ‘ㄱ’자 철조망장벽, 그 아래 두 줄의 코론넨벡이 삼엄히 이어진다. / 사진=손기웅·강동완
▲ ‘기억의 원’ 모습 / 사진=손기웅·강동완
▲ ‘기억의 원’에 남긴 9개의 철조망장벽 지주, 생태적 공생을 잊은 채 길고 아프게 실재했던 분단을 잊지 않는다. / 사진=손기웅
▲ ‘기억의 원’ 중앙의 물 표식돌 / 사진=손기웅
조르게 야외접경박물관을 운영하는 조르게 박물관협회가 베를린장벽 붕괴 20주년을 기념하여 2009년 가을 마을의 옛 정거장 역사(驛舍)를 개조하여 '조르게 접경박물관(Sorge Grenzmuseum)'을 만들었다. 야외박물관에서 8분 거리인 이곳에는 당시 접경지역 상황을 조그만 모델로 만들어 전시하고 있다.
주민 200여 명의 휴양지 마을 조르게는 전쟁 이후 미군에 점령되었다가 다시 소련 점령지로 바뀌었다. 동서독으로 분단(서쪽의 니더작센주, 동쪽의 작센안할트주)된 후 동독이 500m 통제지대를 설정하자 그 안에 속한 조르게 주민도 출입이 통제되었다. 10가구는 사상 의심자로 찍혀 동독의 이른바 '독충(毒蟲) 계획'(15회 '호수 앞에 멈춘 자유, 멈추지 않은 자유행로' 참조)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다. 짙푸른 산림, 등산과 스키, 증기기차노선으로 즐겨 찾은 관광휴양지 조르게는 빛을 잃었다.
▲ 간이 정거장 조르게, 역사가 접경박물관이다. 이곳에서도 브로켄산을 오르는 협궤 증기기차를 탈 수 있다. / 사진=손기웅·Grenzmuseum Sorge e.V.
2021년 가을, 다시 찾은 조르게 야외박물관 곳곳에, 하르츠 국립공원 군데군데에 아름드리 나무들이 쓰러져 누렇게 썩어가고 있다. 채 1년 전에 보지 못한 광경으로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영향이라 한다. 산림 강국, 환경보호 강국 독일도 피하지 못한 지구촌 문제다. 그래도 동쪽과 서쪽이 힘을 합해 함께 대응하는 현실이 행복이고 부럽다. 북한 땅을 마지막으로 밟았던 2007년 11월, 벗겨지고 붉어진 산들이 주마등처럼 스친다.
▲ 황량해진 코론넨벡 숲길, 인간에 의해서다. /사진=손기웅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