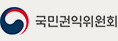[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통일부가 ‘전독부’인가, 명칭 논란의 노림수" (데일리안, 2025.07.18…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93회 작성일 25-07-18 14:49본문
[손기웅의 가야만 하는 길] "통일부가 ‘전독부’인가, 명칭 논란의 노림수" (데일리안, 2025.07.18)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4441/
<사진>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갑론을박하고 있다.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통일부’ 명칭 변경이 입에 오르고 있다. 필자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제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벌써 이곳저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여론도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구태여 추진해 대북정책 초기 동력에 타격을 받을 머리 나쁜 이재명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진짜 의도는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갑론을박 가운데 현 시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북 상호 ‘공존’을 ‘사실상의 통일’로 만들어가려는, 분위기 형성에 있다고 본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이 적시된 민주당 강령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문재인도 사실상 추진했던 노선이다.
특히 ‘2민족·2국가’를 주장하는 김정은에 공존으로 부응함으로써 대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려는 이재명 전략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다.
이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여러 통로를 통해 타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특히 대화 중재자로 러시아에 대한 접근도 감지된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가운데 누가 먼저 선을 끌어내나, 협력이 아니라 경쟁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정부들의 통일·대북정책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독일 사례의 ‘활용’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 통일에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곶감처럼 뽑아 먹는 ‘이용’이다.
독일 통일을 우리 통일의 모범 사례로 삼아 배우고 응용하려는 자세는 결코 아니다. 독일이 헌법인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로, 동독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원인 ‘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존’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서도 독일 사례가 소환되었다. 서독이 동독과 긴장 완화 및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통일부에 비견되는 ‘전독부(全獨部)’를 ‘내독부(內獨部)’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 대결이 아닌 평화로 가기 위해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이 통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맞다, 1969년 서독은 갈등·대립과 관계 단절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동방정책(Ostpolitik)’ 대신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전독부를 내독부로 변경했다.
전독부는 전 독일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부처(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의 줄임말이다. 이에 반해 내독부는 독일 내부적, 즉 동독과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부처(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를 말한다.
핵심 대목은 전독부에서의 ‘전(全)’을 왜 뺐느냐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처벌로 1차 및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반환해야만 했다. 오이펜-말메디, 오스트리아, 슐레지아, 자를란트(1955년 주민 선거에 의해 서독으로 귀속), 엘자스-로트링겐(알자스-로렌), 쥐트티롤(남티롤), 주데텐란트, 단치히 등이 독일 영토에 속했었다.
이런 사정에서 초대 전독부 장관 야콥 카이저는 1951년 3월 2일 다음과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진정한 유럽은 독일의 하나성(Einheit, 즉 통일: 필자 주)이 재건될 때에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37년의 국경(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의 국경: 필자 주)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자를란트 지방, 엘자스-로트링겐이 포함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카이저는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전독부가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빼앗긴 독일 전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라는, 서독이 이 모든 지역의 통일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 것이다.
물론 카이저의 이 발언은 비공개였고, 서독 정부 누구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독부의 독일이 무엇을,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 독일의 지도를 다시 긋고 분할한 전승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도, 독일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비극·참화를 겪은 유럽국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명료하게 밝히고 해명되어야 했다.
이런 사정에서 1963~66년간 전독부 장관을 지냈던 에리히 멘데는 1965년 “전 독일적 사안에는 쥐트티롤이나 엘자스-로트링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우리의 임무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저는 공식 직함으로 통일부(Bundesminister fü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통일사안부 혹은 통일문제부: 필자 주) 장관을 선호합니다”라고 발언해야만 했다.
우리의 통일부가 한민족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한민족 전체의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인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부나 남북관계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가.
서독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명칭 변경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무엇보다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편 우리의 통일이 한민족 전체의 통일로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의 통일 관련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현재의 ‘통일연구원’은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民族統一硏究院)’으로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인 1999년 ‘민족(民族)’이 떼어지고 통일연구원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냐에 관해 확실하게 말하는 이도 없고, 근거도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민족에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거주하는 민족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압록강·두만강의 국경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중국에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했다는 ‘설’이 회자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을 중시했던, 중국의 눈치를 보았던 그 세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도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민족통일연구원의 ‘RINU(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에서 통일연구원의 ‘KINU(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로 바뀌어,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에 대해 헌법을 근거로 통일부 명칭 고수를 주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천이다. 공존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다.
49.42%의 지지로 당선되고 권력을 차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국민 93.1% 지지로 확정된 지금의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24441/
<사진>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갑론을박하고 있다. ⓒ 데일리안 AI 이미지 삽화.
‘통일부’ 명칭 변경이 입에 오르고 있다. 필자는 통일부의 이름을 바꾸는 것이 이재명 정부의 실제 목적이 아니라고 본다.
벌써 이곳저곳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고, 여론도 간단치 않음을 보여주는 현실에서, 구태여 추진해 대북정책 초기 동력에 타격을 받을 머리 나쁜 이재명 정부가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말이 나왔다가 흐지부지되었다.
진짜 의도는 통일부 명칭을 둘러싼 갑론을박 가운데 현 시기, 현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통일,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 어렵다, 가능하지 않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남북 상호 ‘공존’을 ‘사실상의 통일’로 만들어가려는, 분위기 형성에 있다고 본다.
‘통일’이 아니라 ‘공존’이 적시된 민주당 강령에 충실히 하는 것으로, 문재인도 사실상 추진했던 노선이다.
특히 ‘2민족·2국가’를 주장하는 김정은에 공존으로 부응함으로써 대화에 동기를 부여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가려는 이재명 전략의 시작이라 보는 것이다.
이미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여러 통로를 통해 타진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다. 특히 대화 중재자로 러시아에 대한 접근도 감지된다.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실 가운데 누가 먼저 선을 끌어내나, 협력이 아니라 경쟁도 관심거리다.
민주당 정부들의 통일·대북정책에서 특별히 눈여겨볼 부분이 독일 사례의 ‘활용’이다. 정확히 말하면, 독일 통일에서 입맛에 맞는 부분만 골라 곶감처럼 뽑아 먹는 ‘이용’이다.
독일 통일을 우리 통일의 모범 사례로 삼아 배우고 응용하려는 자세는 결코 아니다. 독일이 헌법인 <기본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 헌법과 마찬가지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기본질서(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로, 동독이 사라지고 우리의 염원인 ‘1민족·1국가·1체제·1정부’로 통일되었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공존’과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번 통일부의 명칭 변경에서도 독일 사례가 소환되었다. 서독이 동독과 긴장 완화 및 교류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통일부에 비견되는 ‘전독부(全獨部)’를 ‘내독부(內獨部)’로 변경한 것을 예로 들면서, 북한과 대결이 아닌 평화로 가기 위해 ‘한반도부’, ‘남북관계부’ 등이 통일부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맞다, 1969년 서독은 갈등·대립과 관계 단절을 핵심으로 하는 기존 ‘동방정책(Ostpolitik)’ 대신 동독을 포함한 동구권과의 관계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신동방정책(Neue Ostpolitik)’을 추진하면서 전독부를 내독부로 변경했다.
전독부는 전 독일에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부처(Bundesministerium für gesamtdeutsche Fragen)의 줄임말이다. 이에 반해 내독부는 독일 내부적, 즉 동독과 관계되는 모든 사안을 다루는 부처(Bundesministerium für innerdeutsche Beziehungen)를 말한다.
핵심 대목은 전독부에서의 ‘전(全)’을 왜 뺐느냐 하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독일은 두 번의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그 처벌로 1차 및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영토의 상당 부분을 잃고 반환해야만 했다. 오이펜-말메디, 오스트리아, 슐레지아, 자를란트(1955년 주민 선거에 의해 서독으로 귀속), 엘자스-로트링겐(알자스-로렌), 쥐트티롤(남티롤), 주데텐란트, 단치히 등이 독일 영토에 속했었다.
이런 사정에서 초대 전독부 장관 야콥 카이저는 1951년 3월 2일 다음과 발언으로 논란을 초래했다. “진정한 유럽은 독일의 하나성(Einheit, 즉 통일: 필자 주)이 재건될 때에만 형성될 수 있습니다. 독일은 1937년의 국경(2차 대전을 일으키기 전의 국경: 필자 주) 외에도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부, 자를란트 지방, 엘자스-로트링겐이 포함된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즉 카이저는 자신이 장관으로 있는 전독부가 2차 세계대전은 물론이고 1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빼앗긴 독일 전 영토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부처라는, 서독이 이 모든 지역의 통일을 궁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들게 한 것이다.
물론 카이저의 이 발언은 비공개였고, 서독 정부 누구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전독부의 독일이 무엇을, 어떤 범위를 말하는 것인지에 관해 독일의 지도를 다시 긋고 분할한 전승 4국(미국·영국·프랑스·소련)도, 독일이 일으킨 전쟁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엄청난 비극·참화를 겪은 유럽국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명료하게 밝히고 해명되어야 했다.
이런 사정에서 1963~66년간 전독부 장관을 지냈던 에리히 멘데는 1965년 “전 독일적 사안에는 쥐트티롤이나 엘자스-로트링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와 우리의 임무에 대한 더 정확한 표현을 위해서 저는 공식 직함으로 통일부(Bundesminister für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통일사안부 혹은 통일문제부: 필자 주) 장관을 선호합니다”라고 발언해야만 했다.
우리의 통일부가 한민족 전체의 문제를 다루는, 한민족 전체의 통일을 지향하는 부처인가.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한반도부나 남북관계부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가.
서독이 전독부를 내독부로 명칭 변경한 것은 우리에게 적용될 수 없다. 역사적, 정치적으로, 무엇보다 헌법적으로 맞지 않는다.
한편 우리의 통일이 한민족 전체의 통일로 보여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세력이 분명히 있었다. 우리의 통일 관련 유일한 국책연구기관인 현재의 ‘통일연구원’은 1991년 ‘민족통일연구원(民族統一硏究院)’으로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후인 1999년 ‘민족(民族)’이 떼어지고 통일연구원이 되었다. 왜 그렇게 되었냐에 관해 확실하게 말하는 이도 없고, 근거도 알 수 없다.
다만 당시 민족에 중국 특히 동북 3성에 거주하는 민족도 포함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압록강·두만강의 국경선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중국에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개정했다는 ‘설’이 회자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중국을 중시했던, 중국의 눈치를 보았던 그 세력은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서도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다만 영문표기는 민족통일연구원의 ‘RINU(Research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에서 통일연구원의 ‘KINU(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로 바뀌어, ‘민족통일(National Unification)’은 여전하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 명칭 변경 언급에 대해 헌법을 근거로 통일부 명칭 고수를 주장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의 실천이다. 공존을 의미하는 사실상의 통일이 아니다.
49.42%의 지지로 당선되고 권력을 차지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1987년 10월 27일 실시된 헌법 개정 국민투표에서 국민 93.1% 지지로 확정된 지금의 헌법을 무시하거나 자의적으로 왜곡해서는 안 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