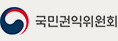[손기웅의 통일토크] "독일연합팀의 해피 엔드, 통일한국팀도 희망의 꿈 접지 말아야... 올림픽 통일의 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29회 작성일 24-08-12 21:04본문
<사진> 마주친 남과 북 선수들 , 11일(현지시간) 프랑스 생드니 스타드 드 프랑스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폐회식에서 북한 기수단 옆으로 우리 선수단이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진>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 pa/picture-allia/dpa/dpa]
<사진> 1956년 멜버른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Bildarchiv Preußischer Kulturbesitz/Hanns Hubmann]
<사진> 올림픽 오륜 문장의 연방기를 들고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AGON SportsWorld GmbH]
[손기웅의 통일토크] "독일연합팀의 해피 엔드, 통일한국팀도 희망의 꿈 접지 말아야... 올림픽 통일의 길"(뉴스퀘스트, 2024.08.12)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12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국민 모두가 더위를 식혔다. 스포츠에는 실패가 없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땀과 눈물, 남모를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다한 모든 선수들을 존경한다.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모으고, 민족 간 상호 이해에 기여해야 한다. 원래의 올림픽 정신이다. 그 중심에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는 표어(標語)에 입각한 스포츠만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다르다. 경쟁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 올림픽은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전언(傳言)·전의(傳意)를 위한 이상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이 올림픽에도 이어졌다. 몇 번의 조우 외에 남북 선수들 간에, 체육 관계자 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대화는 거부되었다.
한반도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며, 많은 국가들이 ‘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러시아 제외를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3년 3월 러시아와 그 조력국 벨라루스를 퇴출시켰다. ‘개인중립선수단(Individual Neutral Athletes)’의 자격으로 선수가 참가하는 것은 허락되었다.
정치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자, 스포츠가 정치에 가한 반격이다. 정치의 의도적·계획적 스포츠 이용은 오래된 역사다. 상징적 사례가 국가사회주의자(나치)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다.
나치는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더해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고 있었다. 압도할만한 엄청나고 화려한 선전·선동 무대로 연출했다.
나치 독일은 전 세계에 개방적이고 호의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체제와 민족을 보여주고자 했다. 히틀러는 독일의 재무장을 희석시켰고, 금메달 33개를 포함한 89개 메달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독일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정치의 스포츠 개입은 끝나지 않았다. 올림픽은 악화되는 동·서방 간 갈등과 냉전 속에서 ‘대리전’이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작가 조지 오웰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총성 없는 전쟁(war minus the shooting)’, 즉 ‘체제전쟁’으로 재개되었다.
그 중심에 새로 출현한 서독과 동독, 독-독 분단 체제가 있었다. 1949년 건국한 서독은 ‘독일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e Olympische Komitee für Deutschland)’를, 역시 1949년 정부를 구성한 동독은 2년 후 ‘동독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e Olympische Komitee der DDR)’를 각각 설립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은 전(全)독일(Deutschland)을, 반면 동독은 새로운 사회주의국가인 동독(DDR)을 대표한다는 의미였다.
한 국가의 올림픽위원회 구성은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IOC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독일의 참가를 배제했으나, 1952년 헬싱키 하계올림픽에는 참가를 허용함에 따른 서독과 동독의 조처였다.
그러나 IOC는 오직 서독위원회만 인정했고, 올림픽에 독일대표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련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땅에 두 개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IOC의 결정은 갓 출범한 동독에게 쓰라린 타격이었다.
서독은 동독의 IOC 가입과 개별적 올림픽 참가를 어떻게든 막고자 했다. 1955년 공식화된 외교정책인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즉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소련 제외)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정책이 이미 작동되고 있었고, 스포츠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IOC는 동독에게 서독과 함께 단일팀을 만들어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제안했다. 동독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치적 계산 결과 이를 받아들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개별적 주권 국가로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서독의 의지에 반해 동독은 1955년 IOC에 가입했고, 1956년 올림픽에 서독과 단일팀으로 참가해야 했다. 1~2월 코르티나담페초(이탈리아) 동계올림픽이 첫 무대였다.
독-독 단일팀은 ‘독일연합팀(Equipe Unifiée Allemande: EUA)’으로 이름 지어졌다. 영어와 독일어로 ‘United Team of Germany’, ‘Gesamtdeutsche Mannschaft’였다.
국기(國旗)로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때 만들어진 검정색, 빨간색, 황금색의 ‘연방기(Bundesflagge)’를 사용했다. 1949년 이후에도 동독은 국기를 따로 만들지 않았으나, 국가(國歌)는 새로 채택함에 따라 독일 땅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 상황이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동서독은 각자의 국가 대신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Ode an die Freude)’가 연주되도록 했다.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독일연합팀은 총 2개의 메달(금1, 동1)을 수확했고, 동독 출신 스키점퍼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동)을 획득했다. 1956년 11~12월 멜버른 하계올림픽에서 독일연합팀은 총 26개의 메달(금 6)을 획득하면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동서독의 단일올림픽대표단 구성은 1964년까지 이어졌다. 1959년 동독은 연방기의 중심에 망치(노동자), 컴퍼스(지식인), 호밀(농민)을 그린 국장(國章)을 넣은 새 국기를 만들었다.
서독은 즉각 ‘분열주의 깃발’이라 비난했으나, 동독은 1960년 로마 하계올림픽에서 자신의 국기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IOC의 중재로 동서독은 독일연합팀의 상징기로 연방기 중앙에 올림픽 오륜 문장(紋章)을 넣는데 동의했다.
1994년 이후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이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었으나, 그 전에는 두 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다. 서독과 동독 선수들은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와 멜버른, 1960년 스쿼밸리(미국)와 로마, 마지막으로 1964년 인스브루크와 도쿄 등 모두 6차례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럼에도 ‘불행한 올림픽 결혼(unglückliche olympische Ehe)’이라 표현되듯이 양 독일 간 긴장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全)독일단일팀에서 ‘스포츠 팀정신’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두 독일의 선수들은 연락은 물론이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선수 선발 방식이나 공동 깃발과 복장을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예선 경기를 위한 적절한 장소 선정, 선수단 단장과 선서하는 선수를 누구로 할지, 서신 교환 때 누구 이름으로 작성할 지를 두고 갈등했다.
불행한 올림픽 혼인 기간 동안 두 독일의 체육계 인사들은 IOC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심한 모욕까지 퍼부었다. 여기에 동독 육상선수 만프레드 슈타인바하와 카린 발쩌가 1958년에 그리고 썰매선수 우테 갤러트가 1964년에 서독으로 탈출하지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수많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전독일단일팀 참여를 통해 자국 선수들의 스포츠 경력을 만들면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로서 동독을 과시할 수 있었다. 마침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올림픽 독립의 길을 열 수 있었다.
1965년 IOC 제63차 회의는 동독의 독자적인 올림픽선수단 구성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1961년 동독의 베를린장벽 건설이 영향을 미쳤다.
서독 국가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장벽 건설에 대한 처벌로 동독을 IOC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IOC의 생각은 달랐다. 양 독일 간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고 죽음의 지역이 된 상황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독-독 협력 기대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독과 동독은 1968년 2월 그르노블(프랑스)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따로 선수단을 구성해 올림픽 메달을 놓고 겨뤘다. 다만 양국은 여전히 올림픽 오륜 연방기를 사용했고, 국가로 여전히 환희의 송가를 불렀다. 10월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독은 1968년 제67차 IOC 총회에서야 자체의 선수단, 깃발, 국가를 가진 동독국가올림픽위원회를 인정받았다. 1972년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부터 드디어 동독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동독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들고 가슴에 붙이고, 자국 국가를 부를 수 있었다. 8~9월 뮌헨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동독은 스포츠 거인이었다. 올림픽에 독자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동독의 메달이 별도로 집계된 이후 순위에서 매번 서독을 앞질렀다.
삿포로 동계올림픽에서 동독 선수단은 메달 순위에서 소련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뮌헨 하계올림픽에서 동독은 독일 땅에서 ‘계급적 적’인 서독을 이겼고,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는 미국을 꺾었다.
1984년에는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스포츠 초강국 소련까지 꺾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독은 1988년 2월 캘거리 동계올림픽과 9~10월 서울 하계올림픽에서 소련에 이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동독은 올림픽 승리를 통해 스포츠적으로 존경을 얻었고, IOC의 정회원이 되어 올림픽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승자의 시상대에 설 때마다 동독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동독의 국가가 울려 퍼졌다.
동독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승리라 선전·선동하고 전파했다. 선수들의 승리는 국가적 화제였다. 쏟아지는 메달로 주민들의 일상적 좌절감을 해소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스포츠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다. 동독 선수들에 열광하고 행운을 비는 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형성되었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동독은 경쟁스포츠에 대한 대규모 지원 외에 도핑에 의존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도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행했다. 1979년 수영선수 레나테 포겔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이자 세계선수권자인 스키 선수 한스-게오르그 아쎈바하가 1988년 동독을 탈출한 후 동독 스포츠에서의 국가 주도 강제 도핑을 폭로했다.
동독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명예와 인정 외에는 승리로부터 얻는 것이 메달 획득을 상업적으로 홍보·활용할 수 있었던 서방의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수천 마르크(M), 새 아파트, 쿠바 여행 또는 예정보다 일찍 배달된 국민승용차 바르트부르크(Wartburg) 등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동독이 최고의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었다. 그만큼 스포츠는 동독 정치의 유용한 도구였다.
독일의 동서쪽 선수들은 1990년 통일에 따른 올림픽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맞섰다. 통일된 독일은 1992년 올림픽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2월 알베르빌(프랑스)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7~8월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도핑 하지 않은 동독 출신 선수들도 이 성과에 당연히 기여했다.
김정은이 '한 민족 한 동포'임을 거부하는 한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은 무망하다. 한 민족 한 동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갖은 지배자의 군림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굳혀졌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조차 그토록 중시했던 한 민족 한 동포를 김정은이 부정한다 해도 그 시간은 역사 속의 한 점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연합팀이 동독의 ‘2국가 2민족’ 주장으로 두 개로 찢어졌다 독일팀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지금의 찢어진 한반도 양쪽의 두 팀이 통일한국팀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 꿈을 접지 말아야 한다.
출발은 우리 스스로 한 민족 한 동포에 대한 사랑이다. 입 열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북한 동포의 몫까지 우리가 더 크고 강하게 한 민족 한 동포를 외치고 주장해야 한다.
<사진>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 pa/picture-allia/dpa/dpa]
<사진> 1956년 멜버른 하계올림픽 개막식에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Bildarchiv Preußischer Kulturbesitz/Hanns Hubmann]
<사진> 올림픽 오륜 문장의 연방기를 들고 입장하는 독일연합팀 [사진=AGON SportsWorld GmbH]
[손기웅의 통일토크] "독일연합팀의 해피 엔드, 통일한국팀도 희망의 꿈 접지 말아야... 올림픽 통일의 길"(뉴스퀘스트, 2024.08.12)
https://www.newsques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9212
파리 올림픽이 막을 내렸다. 우리 선수들의 선전에 국민 모두가 더위를 식혔다. 스포츠에는 실패가 없고 더 나은 결과를 위한 도전이 있을 뿐이다. 땀과 눈물, 남모를 어려움을 견디며 힘을 다한 모든 선수들을 존경한다.
올림픽은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을 평화롭게 하나로 모으고, 민족 간 상호 이해에 기여해야 한다. 원래의 올림픽 정신이다. 그 중심에는 ‘더 빨리, 더 높이, 더 멀리’라는 표어(標語)에 입각한 스포츠만이 있어야 한다.
현실은 다르다. 경쟁의 국제적 특성으로 인해 올림픽은 오히려 다양한 정치적 전언(傳言)·전의(傳意)를 위한 이상적 공간이 되기도 한다.
얼어붙은 한반도 상황이 올림픽에도 이어졌다. 몇 번의 조우 외에 남북 선수들 간에, 체육 관계자 간에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고 대화는 거부되었다.
한반도만이 아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난하며, 많은 국가들이 ‘평화의 제전’ 올림픽에 러시아 제외를 요구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2023년 3월 러시아와 그 조력국 벨라루스를 퇴출시켰다. ‘개인중립선수단(Individual Neutral Athletes)’의 자격으로 선수가 참가하는 것은 허락되었다.
정치가 스포츠에 미친 영향이자, 스포츠가 정치에 가한 반격이다. 정치의 의도적·계획적 스포츠 이용은 오래된 역사다. 상징적 사례가 국가사회주의자(나치)의 1936년 베를린 올림픽이다.
나치는 올림픽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활용될 수 있을지에 더해 어떻게 활용할지도 알고 있었다. 압도할만한 엄청나고 화려한 선전·선동 무대로 연출했다.
나치 독일은 전 세계에 개방적이고 호의적이면서도 강력한 국가·체제와 민족을 보여주고자 했다. 히틀러는 독일의 재무장을 희석시켰고, 금메달 33개를 포함한 89개 메달로 종합 1위를 차지하면서 독일 민족의 신체적 우월성을 과시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도 정치의 스포츠 개입은 끝나지 않았다. 올림픽은 악화되는 동·서방 간 갈등과 냉전 속에서 ‘대리전’이란 정치적 의미를 부여받았다. 작가 조지 오웰이 적절히 표현했듯이 ‘총성 없는 전쟁(war minus the shooting)’, 즉 ‘체제전쟁’으로 재개되었다.
그 중심에 새로 출현한 서독과 동독, 독-독 분단 체제가 있었다. 1949년 건국한 서독은 ‘독일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e Olympische Komitee für Deutschland)’를, 역시 1949년 정부를 구성한 동독은 2년 후 ‘동독국가올림픽위원회(Nationale Olympische Komitee der DDR)’를 각각 설립했다.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서독은 전(全)독일(Deutschland)을, 반면 동독은 새로운 사회주의국가인 동독(DDR)을 대표한다는 의미였다.
한 국가의 올림픽위원회 구성은 올림픽 참가를 위한 전제 조건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IOC는 전쟁을 일으킨 책임을 물어 1948년 런던 하계올림픽에 독일의 참가를 배제했으나, 1952년 헬싱키 하계올림픽에는 참가를 허용함에 따른 서독과 동독의 조처였다.
그러나 IOC는 오직 서독위원회만 인정했고, 올림픽에 독일대표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소련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일 땅에 두 개의 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다는 IOC의 결정은 갓 출범한 동독에게 쓰라린 타격이었다.
서독은 동독의 IOC 가입과 개별적 올림픽 참가를 어떻게든 막고자 했다. 1955년 공식화된 외교정책인 ‘할슈타인 원칙(Hallstein Doctrine)’, 즉 서독만이 독일의 유일한 합법 정부이며, 동독을 승인하거나 동독과 수교하는 국가(소련 제외)와는 외교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정책이 이미 작동되고 있었고, 스포츠에도 당연히 적용되었다.
IOC는 동독에게 서독과 함께 단일팀을 만들어 올림픽에 참가하라고 제안했다. 동독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정치적 계산 결과 이를 받아들였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제사회로부터 개별적 주권 국가로 인정받기 원했기 때문이었다.
서독의 의지에 반해 동독은 1955년 IOC에 가입했고, 1956년 올림픽에 서독과 단일팀으로 참가해야 했다. 1~2월 코르티나담페초(이탈리아) 동계올림픽이 첫 무대였다.
독-독 단일팀은 ‘독일연합팀(Equipe Unifiée Allemande: EUA)’으로 이름 지어졌다. 영어와 독일어로 ‘United Team of Germany’, ‘Gesamtdeutsche Mannschaft’였다.
국기(國旗)로 1919년 바이마르공화국 때 만들어진 검정색, 빨간색, 황금색의 ‘연방기(Bundesflagge)’를 사용했다. 1949년 이후에도 동독은 국기를 따로 만들지 않았으나, 국가(國歌)는 새로 채택함에 따라 독일 땅에 2개의 국가가 존재한 상황이었다. 올림픽 무대에서 동서독은 각자의 국가 대신 베토벤 교향곡 9번 ‘환희의 송가(Ode an die Freude)’가 연주되도록 했다.
코르티나담페초에서 독일연합팀은 총 2개의 메달(금1, 동1)을 수확했고, 동독 출신 스키점퍼가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메달(동)을 획득했다. 1956년 11~12월 멜버른 하계올림픽에서 독일연합팀은 총 26개의 메달(금 6)을 획득하면서 종합 7위를 차지했다.
동서독의 단일올림픽대표단 구성은 1964년까지 이어졌다. 1959년 동독은 연방기의 중심에 망치(노동자), 컴퍼스(지식인), 호밀(농민)을 그린 국장(國章)을 넣은 새 국기를 만들었다.
서독은 즉각 ‘분열주의 깃발’이라 비난했으나, 동독은 1960년 로마 하계올림픽에서 자신의 국기를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IOC의 중재로 동서독은 독일연합팀의 상징기로 연방기 중앙에 올림픽 오륜 문장(紋章)을 넣는데 동의했다.
1994년 이후 하계 및 동계 올림픽이 2년마다 번갈아 개최되었으나, 그 전에는 두 올림픽이 같은 해에 열렸다. 서독과 동독 선수들은 1956년 코르티나담페초와 멜버른, 1960년 스쿼밸리(미국)와 로마, 마지막으로 1964년 인스브루크와 도쿄 등 모두 6차례 단일팀으로 올림픽에 참가했다.
그럼에도 ‘불행한 올림픽 결혼(unglückliche olympische Ehe)’이라 표현되듯이 양 독일 간 긴장된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전(全)독일단일팀에서 ‘스포츠 팀정신’은 만들어질 수 없었다. 두 독일의 선수들은 연락은 물론이고 서로 대화조차 하지 않았다.
관계자들은 선수 선발 방식이나 공동 깃발과 복장을 어떻게 할지 등을 두고 논란을 벌였다. 예선 경기를 위한 적절한 장소 선정, 선수단 단장과 선서하는 선수를 누구로 할지, 서신 교환 때 누구 이름으로 작성할 지를 두고 갈등했다.
불행한 올림픽 혼인 기간 동안 두 독일의 체육계 인사들은 IOC와 소통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심한 모욕까지 퍼부었다. 여기에 동독 육상선수 만프레드 슈타인바하와 카린 발쩌가 1958년에 그리고 썰매선수 우테 갤러트가 1964년에 서독으로 탈출하지 갈등은 더욱 첨예화되었다.
수많은 다툼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전독일단일팀 참여를 통해 자국 선수들의 스포츠 경력을 만들면서, 스포츠 강국의 면모로서 동독을 과시할 수 있었다. 마침내 독자적으로 참가하는 올림픽 독립의 길을 열 수 있었다.
1965년 IOC 제63차 회의는 동독의 독자적인 올림픽선수단 구성을 허용했다. 무엇보다 1961년 동독의 베를린장벽 건설이 영향을 미쳤다.
서독 국가올림픽위원회는 IOC에 장벽 건설에 대한 처벌로 동독을 IOC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으나 IOC의 생각은 달랐다. 양 독일 간 국경이 완전히 차단되고 죽음의 지역이 된 상황에서 스포츠 분야에서 독-독 협력 기대는 점점 더 터무니없는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서독과 동독은 1968년 2월 그르노블(프랑스) 동계올림픽에서 처음으로 따로 선수단을 구성해 올림픽 메달을 놓고 겨뤘다. 다만 양국은 여전히 올림픽 오륜 연방기를 사용했고, 국가로 여전히 환희의 송가를 불렀다. 10월 멕시코시티 하계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동독은 1968년 제67차 IOC 총회에서야 자체의 선수단, 깃발, 국가를 가진 동독국가올림픽위원회를 인정받았다. 1972년 2월 일본 삿포로에서 열린 동계올림픽부터 드디어 동독의 염원이 이루어졌다, 처음으로 동독 선수단이 자국 국기를 들고 가슴에 붙이고, 자국 국가를 부를 수 있었다. 8~9월 뮌헨 올림픽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작은 동독은 스포츠 거인이었다. 올림픽에 독자 선수단을 파견하면서 스포츠 강국으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다졌다. 1968년 멕시코시티 올림픽부터 동독의 메달이 별도로 집계된 이후 순위에서 매번 서독을 앞질렀다.
삿포로 동계올림픽에서 동독 선수단은 메달 순위에서 소련에 이어 종합 2위를 차지했다. 뮌헨 하계올림픽에서 동독은 독일 땅에서 ‘계급적 적’인 서독을 이겼고, 1976년 몬트리올 하계올림픽에서는 미국을 꺾었다.
1984년에는 사라예보 동계올림픽에서는 미국은 물론이고 스포츠 초강국 소련까지 꺾고 종합 1위를 차지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동독은 1988년 2월 캘거리 동계올림픽과 9~10월 서울 하계올림픽에서 소련에 이어 종합 2위를 달성했다.
동독은 올림픽 승리를 통해 스포츠적으로 존경을 얻었고, IOC의 정회원이 되어 올림픽 가족의 완전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정치적 목표를 달성했다. 파란색과 흰색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이 승자의 시상대에 설 때마다 동독의 국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동독의 국가가 울려 퍼졌다.
동독 공산당은 사회주의의 승리라 선전·선동하고 전파했다. 선수들의 승리는 국가적 화제였다. 쏟아지는 메달로 주민들의 일상적 좌절감을 해소해 주었고, 많은 사람들이 자국의 스포츠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었다. 동독 선수들에 열광하고 행운을 비는 팬들이 국내는 물론이고 해외에도 형성되었다.
최고의 성과를 내기 위해 동독은 경쟁스포츠에 대한 대규모 지원 외에 도핑에 의존했다. 지난 칼럼에서 언급한대로 도핑을 국가적 차원에서 감행했다. 1979년 수영선수 레나테 포겔에 이어, 올림픽 금메달 획득자이자 세계선수권자인 스키 선수 한스-게오르그 아쎈바하가 1988년 동독을 탈출한 후 동독 스포츠에서의 국가 주도 강제 도핑을 폭로했다.
동독의 올림픽 메달 수상자들은 명예와 인정 외에는 승리로부터 얻는 것이 메달 획득을 상업적으로 홍보·활용할 수 있었던 서방의 경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다. 현금 수천 마르크(M), 새 아파트, 쿠바 여행 또는 예정보다 일찍 배달된 국민승용차 바르트부르크(Wartburg) 등이었다.
그럼에도 그것은 동독이 최고의 선수들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지원이었다. 그만큼 스포츠는 동독 정치의 유용한 도구였다.
독일의 동서쪽 선수들은 1990년 통일에 따른 올림픽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서로 맞섰다. 통일된 독일은 1992년 올림픽에서 그 어느 때보다 큰 성공을 거두었다. 2월 알베르빌(프랑스) 동계올림픽에서 종합 1위를, 7~8월 바르셀로나 하계올림픽에서 종합 3위를 차지했다. 도핑 하지 않은 동독 출신 선수들도 이 성과에 당연히 기여했다.
김정은이 '한 민족 한 동포'임을 거부하는 한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은 무망하다. 한 민족 한 동포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 갖은 지배자의 군림 속에서도 면면히 이어지고 굳혀졌다. 자신의 할아버지, 아버지조차 그토록 중시했던 한 민족 한 동포를 김정은이 부정한다 해도 그 시간은 역사 속의 한 점에 불과할 것이다.
독일연합팀이 동독의 ‘2국가 2민족’ 주장으로 두 개로 찢어졌다 독일팀으로 하나가 되었듯이, 지금의 찢어진 한반도 양쪽의 두 팀이 통일한국팀으로 될 수 있다는 희망, 꿈을 접지 말아야 한다.
출발은 우리 스스로 한 민족 한 동포에 대한 사랑이다. 입 열 수 없고 행동할 수 없는 북한 동포의 몫까지 우리가 더 크고 강하게 한 민족 한 동포를 외치고 주장해야 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